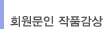사는이야기/ 칠성담 (권정남)
페이지 정보

본문
사는이야기 / 칠성담(七星潭)
권정남(시인)
설악산 입구 바닷가, 파도가 거품을 물고 몰려왔다가 몰려간다. 초여름 햇살 탓인지 바다는 연초록빛을 띄고 있다. 바람에 실려 오는 바다내음 때문인지 문득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났던 ‘칠성담’ 해변이 생각났다.
지난해 11월말, 대만 관광 마지막 날이었다. 화련지방에 있는 태로각 협곡을 가는 도중 ‘칠성담’ 해변엘 들렀다. 청남 빛 푸른 천을 펼쳐 놓은 듯한 바다는 동해안 여느 해변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해변은 모래사장이 아닌 부서진 검은 조약돌 가루로 되어있었고 크고 작은 몽돌이 끝없이 널려 있었다. 해변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비석 같은 표식판에는 ‘七星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예전에 일곱 개 호수가 이곳에 있었는데 오랜 세월동안 침식이 되어 바다로 변했다고 했다. 또한 이 바닷가에 서면 밤하늘 북두칠성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칠성담(七星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다. 그 말이 ‘찡!’ 하는 울림으로 뇌리에 스쳤다. 정말 멋지고도 의미 있는 이름이다. “칠성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라는 김춘수 시인이 쓴 시 한 구절처럼 순간, ‘칠성담’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 맞아 별은 희망과 꿈 그리고 그리움을 상징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바다를 바라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는 파도가 흡사 흰 옷 입은 무희(舞姬)가 물위에서 한바탕 강신무를 추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칠성담’이 내 몸 속 혈관을 타고 출렁 거리기 시작했고 그리움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유년시절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우면 별들이 얼굴 가득 은가루처럼 쏟아지곤 했다. 밤하늘에 국자모양으로 선명하게 떠있던 북두칠성을 보고 동생과 나는 알퐁스 도테의 ‘별’을 이야기하고 윤동주의 ‘별헤는 밤’ 시를 외우며 작가의 꿈을 키우지 않았던가? 그 동안 세상과 부대끼며 바쁘다는 이유로, 때론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을 안 보고 산 세월이 얼마였던가? 가슴이 저려왔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발아래 몽돌을 보니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며 합창을 하듯 파도가 쏠릴 때 마다 ‘차르르 차르르’ 소리를 내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눈에 띄는 대로 애기 조막손 같기도 하고 타조알 같은 몽돌 몇 개를 주웠다. 파도에 깎이다가 못해 닳아 버린 몸(身)들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방금 아침 해가 떠오를 듯, 수평선 같은 흰 띠를 몸에 두른 것도 있고, 행운의 숫자 7이 써진 것도 있고, 나이테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꽃모양 같은 문양들이 많이 있었다. 아무리 쳐다봐도 싫증나지 않는 파도가 그린 돌의 문신이다. 피돌기다. 육신이 깎여져 나가는 고통을 견뎌낸 세월의 지문이고 오랜 세월동안 북두칠성과 눈 맞춤한 사리(舍利)들이다. 자신을 삭혀내듯 세상과 타협하며 둥글게 둥글게 아름다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참한 돌들의 마음이다. 부끄럽게도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삐죽삐죽 모난 돌들이 많다. 그 모난 것 때문에 때론 나를 찌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았던가? 얼마나 더 세상과 부대끼고 세월 앞에 깎여져야만 스스로 몽돌처럼 둥글어진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안의 거문고소리 같은 나만의 울림, 그 청정한 여운을 들을 수가 있을까?
‘ 一日淸閑 一日仙이라’ 오늘 하루 맑고 편안하게 산다면 오늘 하루 신선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초승달처럼 생긴 ‘칠성담’ 해변에서 강신무를 추던 파도도 만나고 북두칠성과 눈맞춤한 몽돌하고 마음도 나누며 천천히 해변을 거닐었다. 마치 내가 신선(神仙)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 행복한 오후 한나절이었다.
요즘 예상치 않았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가슴 아파했다. 금년에는 전국을 흔드는 ‘메르스’ 공포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삶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별을 바라보듯 힘든 난관을 극복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한다. 세찬 파도가 몰려오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차르르 차르르’ 어깨를 맞대며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선(善)한 몽돌처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 존엄한 별이고 삶 속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설악산 입구, 연초록 바다 위로 다시 집채 만 한 파도가 흰 치맛자락 날리며 달려온다. ‘칠성담!’ 그 파도소리, 몽돌소리, 바람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흰 구름이 떠있던 태평양 한가운데 하늘이 실루엣으로 겹쳐져온다.
(설악신문 6.29일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이전글고윤홍렬회장님 추모식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15.07.03
- 다음글설악문우회, 2권으로 나눠 제작 오는 7월 11일 1주기 추모 행사 ‘윤홍렬 문화예술장학회’ 발족 15.07.01
댓글목록

노금희님의 댓글
노금희 작성일설악해변의 몽돌해변은 조금 있엇는데 지금은 해안선이 변형되면서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br />거제 몽돌에 갔을데 차르르 밀려오고 밀려가던 파도소리가 되살아납니다.<br />대만에 가면 칠성담을 꼭 돌아봐야 겠습니다.

박명자님의 댓글
박명자 작성일칠성담. 몽골에 가서 칠성담을 보고 싶다. 그러한 기억의 편린들이 현재의 권정남 문학의 내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잇을것이다. 문학은 자기 체험의 승화 라고 하지 않는가/

최명선님의 댓글
최명선 작성일아주 낮은 곳에서 쉬임 없이 자기를 깎고 있는 몽돌, <br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영애님의 댓글
정영애 작성일선생님의 글이 지금 내 혈관을 타고 돌아갑니다.<br />잘 읽었습니다.

이진여님의 댓글
이진여 작성일내삶의 주인공인 나를 깎는 고통을 멈추지 말아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