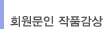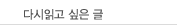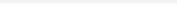вАШмЛЬвАЩмЩА вАШмЙђвАЩ мВђмЭі / мЭімІДмЧђ
нОШмЭімІА м†Хл≥і

л≥ЄлђЄ
к∞ИлЂЉ 44мІС 282м™љ
вАШмЛЬвАЩмЩА вАШмЙђвАЩ мВђмЭі
¬†¬†¬†¬†¬†¬†¬†¬†¬†¬†¬†¬†¬†¬†¬†¬†¬†¬†¬†¬†¬†¬†¬†¬†¬†¬†¬†¬†¬†¬†¬†¬†¬†¬†¬†¬†¬†¬†¬†¬†¬† мЭімІДмЧђ
мВЉк≤ємВімЧР мИШлЛ§к∞А мЦЉкЈЉнХімІАмЮР лЖН мЮШ мєШлКФ м≤†лђЉм†Р л∞ХмФ® мЩЄмґЬнХШлКФ
лґАмЭЄ л≥ік≥† лШР мЛЬ нХШлЯђ к∞АлГР лЖАл¶∞лЛ§лКФ лІРмЧР мЛЬ мЭЄмІА мЙђмЭЄмІА нЧЈк∞Ил¶∞лЛ§
к≥† нХЬлІИлФФмФ© к±∞лУЬлКФлН∞ мЛЬ нХЬ нОЄмЭі мЙђ нХЬ л≤И нХШлКФ кЈЄлІМнБЉ лРРмЬЉл©і мҐЛ
к≤†лЛ§ мЛґмЭАлН∞ к∞Єл•µнХШк≤М л≤ИмЧ≠лРЬ лЕЄмИЩмЧРк≤М мЖМм£Љ нХЬ мЮФлПД мХДлЛМ л≥Д мДЄ к∞Ь
лђімГБмЬЉл°Ь к±ЄмЦі лЖУк≥† нХШлКШ л≥Д мИЂмЮРлІМнБЉ л≤МмЦілУ§мЭЄлЛ§лКФлН∞ мХДнММнКЄмЧР мЮР
лПЩм∞®лІМнБЉ мЛЬл•Љ мПЯмХДлВЄлУ§ мЭАнХШмИШ л≥Д нХШлВШл°ЬлПД нЭРл•імІА л™їнХі мШЖмІС нХі
л≥СлМА нЗімЧ≠ кµ∞мЭЄ лУ±лЛ®мЧР лЛњмХДлПД лВі кЈАлКФ лНФ мЭімГБ л∞ЬкЄ∞нХШмІА мХКлКФлН∞ мЛЬ
к∞А л∞• л©ХмЧђм£ЉлГР нХШл¶імЧЖлКФ лВ®нОЄ лІРмЭі мХЮмДЬк±∞лЛИ лТ§мДЬк±∞лЛИ лФ∞лЭЉ лВШмД§
лХМ лИИ мЛЬл¶∞ мД§мХЕмЭШ к∞АлЮСмЭі мВђмЭіл°Ь лУ§мЦімХЙлКФ лПЩнХі лВі мЦілКР мВік∞ЧмЧРлЭЉ
лПД мК§л©∞мШ® мД§мЫА к∞ЩмЭА к≤Г лУ§ лђімК® нММлПЩм≤ШлЯЉ мЛЬ л™ЄмВімЭі мЭЉмЦі кЈЄ мЖНмЬЉ
л°Ь л™®лЭљл™®лЭљ нЭШ놧л≥ілВік≥† нЧИлђЉмЦімІАлКФ л™Є нХШлВШ нМљнМљнЮИ лЛєкЄілЛ§л©і лВЬмГЭ
лґБмЦім≤ШлЯЉ лї£лї£нХШлНШ лВ®нОЄ мКімКінХШк≤МлВШлІИ м£ЉмЦµк±∞л¶інЕРлН∞
мЙђ к∞ЩмЭА мЛЬ нХЬ нОЄ лИДк±∞лВШ мШБмЫРм≤ШлЯЉ нЧИлІЭнХШк±∞лВШ
- мЭім†ДкЄАнЭФлУ§л¶ђлКФ 11мЫФ / м°∞мШБмИЩ 14.12.29
- лЛ§мЭМкЄАмЮЕмШБ / м°∞мЩЄмИЬ 14.12.29
лМУкЄАл™©л°Э
лУ±л°ЭлРЬ лМУкЄАмЭі мЧЖмКµлЛИл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