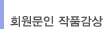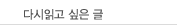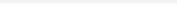갈뫼원고<성자,벚나무외 9편>
페이지 정보

본문
* 성자(聖子), 벚나무
구룡령 아래 현서 분교 마당엔
오랜 벚나무 한 그루가 있네
달빛 쏟아지는 밤이면
뿌리하나 땅에 내리고
꽃피움을 위하여 명상에 잠겨있는 나무
그 나무아래 놀던 아이들 눈동자는
훗날 빛이 되어 남아 있다네
현서 분교 오래된 벚나무를 보면
비바람 맞으며
평생 한자리에 자신을 가두어놓고
묵상에 잠긴 봉쇄수도원 수도사가
인도의 성자 싯달타가 생각이 나네
몸 안의 자신을 삭이면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들
만개한 벚나무를 만나러
사월이면 분교 마당엔 사람들이 모이네
수천의 꽃잎들이
지상에 아름다운 말씀 전하기 위해
공중에서 나비 되네, 꽃비 되네
허공을 흔드는 꽃들의 눈짓
하르르 하르르
땅을 적시고
세상 어두운 곳 적셔주고
벚꽃 잎 떨어지듯 봄날이 가면
차르륵 차르륵
성자들의 옷이 지상에 끌리는 소리
* 건봉사 담쟁이
오월 어느 날이었어
건봉사 적멸보궁 뒷뜰 담쟁이가
담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천천히, 그리고 느릿느릿
가파른 담벼락에 온 몸 바싹 붙어서
생(生)을 오르듯이
맨손으로 그렇게 오르고 있었어
세상욕망 바람에 날려 버린 듯
집착의 끈마저 훌훌 털어 버린 게야
적멸보궁 염불 소리에 조용히 귀를 키우고 있었어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바람이 이파리와 줄기를 세차게 흔들어도
우르르 초록 함성으로 몰려다니며
저희끼리 상처 내지는 않았어
저기 좀 봐 선두로 오르던 담쟁이가
기왓장에 올라앉아 맨손으로
하늘을 윤기 나게 닦고 있잖아
높이 오를수록 반질반질 그렇게 마음도
유리알처럼 닦아내는 거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오월 석탑꼭대기, 꽃구름 그 너머로
느릿느릿
온몸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그렇게 올라가야만 하는 거야
* 플렛폼과 목화
죽령 역 철로변
가을 헷빛에 목화가
송이송이 익어 가고있다
열차가 플렛폼으로 들어서자
잠깐 차에서 내린 노인이
눈보다 흰 목화를 정신없이
따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
신라적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은
수로부인에게 바치려고
바닷가 벼랑에서
연분홍 진달래를 꺾었다는데
바람에 수염 날리며 노인은
누구에게 바치려고
목화를 따고있는가
흰 꽃 다발을 안고 노인이
흔들리듯 다시 차에 올라타자
끝간데 없이 열차는 떠나버리고
목화만 흰 그리움 되어
둥둥 떠다니는
늦가을
죽령 역 플렛폼
* 통리역 안개
통리역 안개는
철로 변 코스모스 목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나한정역과 흥전역 사이
스위치백으로 오르는 기차를
따라서 좇아 오르다가
바위산 건너 뛰어
하늘, 땅 경계 없이 쏘다니다가
통리 협곡 벗어난 바람몰이 안개는
고원지대 수수밭 맨발로 난타하다가
수 십 마리 하이애나 무리되어
낭떠러지 소나무에
칭칭 꼬리 감고 휘 돌다가
내가 그어놓은 금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를
하늘, 땅 금 밖으로 나오라고
미세한 물방울들의 무리가
차창에 매달려서
나를 흔들다가
* 옮겨 심은 장미
꽃집에서 사온 분홍빛 장미가
베란다에서 잘 자라지를 못 해
아파트 담 밑에 옮겨 심었다.
아침 방송에 독일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으러 나왔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그 청년이
부산 어느 보육원에서 버려졌노라며
눈물 글썽인다
우연히 아파트 담 밑을 지나다보니
달포 전에 옮겨심은 장미가
흙더미 위에서 뿌리내려
분홍빛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자기색깔과 향기를 지니고
공학 박사 되어 돌아온 독일 입양아
내가 시든 장미를 옮겨심어 놓고
어린 꽃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듯이
마음이 떠난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고국 방송에 나와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어요."
싱싱한 그 청년이 활짝 핀 장미 되어
어설픈 모국어로 떠듬떠듬 말을 한다
* 비상을 꿈꾸며
재활용 폐기장에서
하늘을 이고 있는 튼실한 널빤지를 만났다
어릴 적 널 뛰던 생각이 났다
심호흡하고 무릎에 힘주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하늘에 닿을 듯
별이 되고 싶으면 별이 되었고
새가 되고 싶으면
치마와 머리카락이 새처럼 날았다
다시 한번 발바닥을 세차게 구르면
무지개 되어 구름 위에 걸쳐 졌고
공중에 꽃잎 되어
흔들리며 내려올 땐
세상이 온통 눈 아래였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의 널 위에서
발바닥을 세차게 굴러본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나는 별이 되지도, 새가 되지도 않는다
내가 나를 벗어나려고 하면
미세한 것들에게까지 내 몸이 묶여서
꼼짝 할 수 없지만
매일 비상을 꿈꾸며
나는 세상 위에서 널뛰기를 한다
* 오른쪽 어깨가 쑤셔온다.
다른 사람들의 시를 꺼내서 읽다가
쓰다가만 내 시를 고치다가
시를 버리다가
바람 부는 바닷가에 나갔다.
크고 작은 돌멩이를 주워 오른쪽 팔로
바다를 향해 던졌다.
되도록 이면 멀리, 아주 멀리
던져진 자리 흔적이 생기기를 바랬지만
그 자리엔 잠시 세찬 물살만 일 뿐
이내 파도가 덮어 버려
던져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나는 매일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진다.
시를 쓰는 일과
바다에 돌 던지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쑤셔온다.
* 밤(夜), 청초호
청초호 한 가운데서
누가 살풀이춤 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호수 위를 둥둥 걸어가다가
은빛 날개옷 되어 떠내려가더니
함경도 앞 바다 그리워
버선발로 물위를 건너뛰다가
흰 수건 던져놓고 쓰러지다가
아름다운 목 뒤로 꺾으며
별을 움켜잡다가
푸른 밤
물위에서 누가 살풀이춤 춘다.
두고 떠나 온 눈동자를 위하여
안개 숲을 가로지르다가
흰 꽃등 되어 미끄러지다가
도시 불빛 양손에 들고
이승과 저승
남과 북을
버선발로 건너뛰고 있다
* 어떤 수배자
눈썹 짙은 사나이가
영동선열차 안에서 봄 강산 내다 보고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쏘아대는 주파수에
몸 움추리며 긴장의 촉수 바짝 세우고있다
비닐 봉지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다가
다시 세상과 연결 고리 맺으려는 듯
누런 명함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잘못 들어선 인생의 벼랑길에서
속죄하듯 고독한 과거 속으로 들어가
까만 손톱밑 쉴새없이 염주 알 굴리고 있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어떤 사나이가
흔들리는 눈동자 그 너머
산 벚꽃 환한 차 창 밖을 내다보고있다
* 봄이 오고 있더라
설악산 깊은 계곡
보일 듯 말 듯 산수유가
깨금발로 서서
꽃망울 트고있더라
노란 그 모습 어찌 이쁜지
목욕탕에서 훔쳐 본
열 서너 살쯤 된 계집애
톡 불거진 젖 망울 같아서
넋 놓고 쳐다보고 있으니
잔설(殘雪)에 몸 털던 설악이
그런 나를
빙그레 내려보고 있더라
봄이 오고 있더라
* 시작 노트
안개 낀 통리역을 지나왔다.
태백산 정상에서 무한시공(無限時空)을
경계도 없이 떠도는 물방울들의
무리가 부러웠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면 타인들이
그어 놓은 금 안에서 나는 살아 왔고
또 그렇게 살아 갈 것이다
여러 번 계절이 지나갔다
나이 들어간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요즘
미세한 물방울의 무리처럼 내 영혼의 자유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구룡령 아래 현서 분교 마당엔
오랜 벚나무 한 그루가 있네
달빛 쏟아지는 밤이면
뿌리하나 땅에 내리고
꽃피움을 위하여 명상에 잠겨있는 나무
그 나무아래 놀던 아이들 눈동자는
훗날 빛이 되어 남아 있다네
현서 분교 오래된 벚나무를 보면
비바람 맞으며
평생 한자리에 자신을 가두어놓고
묵상에 잠긴 봉쇄수도원 수도사가
인도의 성자 싯달타가 생각이 나네
몸 안의 자신을 삭이면서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들
만개한 벚나무를 만나러
사월이면 분교 마당엔 사람들이 모이네
수천의 꽃잎들이
지상에 아름다운 말씀 전하기 위해
공중에서 나비 되네, 꽃비 되네
허공을 흔드는 꽃들의 눈짓
하르르 하르르
땅을 적시고
세상 어두운 곳 적셔주고
벚꽃 잎 떨어지듯 봄날이 가면
차르륵 차르륵
성자들의 옷이 지상에 끌리는 소리
* 건봉사 담쟁이
오월 어느 날이었어
건봉사 적멸보궁 뒷뜰 담쟁이가
담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천천히, 그리고 느릿느릿
가파른 담벼락에 온 몸 바싹 붙어서
생(生)을 오르듯이
맨손으로 그렇게 오르고 있었어
세상욕망 바람에 날려 버린 듯
집착의 끈마저 훌훌 털어 버린 게야
적멸보궁 염불 소리에 조용히 귀를 키우고 있었어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바람이 이파리와 줄기를 세차게 흔들어도
우르르 초록 함성으로 몰려다니며
저희끼리 상처 내지는 않았어
저기 좀 봐 선두로 오르던 담쟁이가
기왓장에 올라앉아 맨손으로
하늘을 윤기 나게 닦고 있잖아
높이 오를수록 반질반질 그렇게 마음도
유리알처럼 닦아내는 거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오월 석탑꼭대기, 꽃구름 그 너머로
느릿느릿
온몸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그렇게 올라가야만 하는 거야
* 플렛폼과 목화
죽령 역 철로변
가을 헷빛에 목화가
송이송이 익어 가고있다
열차가 플렛폼으로 들어서자
잠깐 차에서 내린 노인이
눈보다 흰 목화를 정신없이
따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
신라적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은
수로부인에게 바치려고
바닷가 벼랑에서
연분홍 진달래를 꺾었다는데
바람에 수염 날리며 노인은
누구에게 바치려고
목화를 따고있는가
흰 꽃 다발을 안고 노인이
흔들리듯 다시 차에 올라타자
끝간데 없이 열차는 떠나버리고
목화만 흰 그리움 되어
둥둥 떠다니는
늦가을
죽령 역 플렛폼
* 통리역 안개
통리역 안개는
철로 변 코스모스 목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나한정역과 흥전역 사이
스위치백으로 오르는 기차를
따라서 좇아 오르다가
바위산 건너 뛰어
하늘, 땅 경계 없이 쏘다니다가
통리 협곡 벗어난 바람몰이 안개는
고원지대 수수밭 맨발로 난타하다가
수 십 마리 하이애나 무리되어
낭떠러지 소나무에
칭칭 꼬리 감고 휘 돌다가
내가 그어놓은 금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나를
하늘, 땅 금 밖으로 나오라고
미세한 물방울들의 무리가
차창에 매달려서
나를 흔들다가
* 옮겨 심은 장미
꽃집에서 사온 분홍빛 장미가
베란다에서 잘 자라지를 못 해
아파트 담 밑에 옮겨 심었다.
아침 방송에 독일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으러 나왔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그 청년이
부산 어느 보육원에서 버려졌노라며
눈물 글썽인다
우연히 아파트 담 밑을 지나다보니
달포 전에 옮겨심은 장미가
흙더미 위에서 뿌리내려
분홍빛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자기색깔과 향기를 지니고
공학 박사 되어 돌아온 독일 입양아
내가 시든 장미를 옮겨심어 놓고
어린 꽃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듯이
마음이 떠난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고국 방송에 나와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어요."
싱싱한 그 청년이 활짝 핀 장미 되어
어설픈 모국어로 떠듬떠듬 말을 한다
* 비상을 꿈꾸며
재활용 폐기장에서
하늘을 이고 있는 튼실한 널빤지를 만났다
어릴 적 널 뛰던 생각이 났다
심호흡하고 무릎에 힘주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하늘에 닿을 듯
별이 되고 싶으면 별이 되었고
새가 되고 싶으면
치마와 머리카락이 새처럼 날았다
다시 한번 발바닥을 세차게 구르면
무지개 되어 구름 위에 걸쳐 졌고
공중에 꽃잎 되어
흔들리며 내려올 땐
세상이 온통 눈 아래였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의 널 위에서
발바닥을 세차게 굴러본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나는 별이 되지도, 새가 되지도 않는다
내가 나를 벗어나려고 하면
미세한 것들에게까지 내 몸이 묶여서
꼼짝 할 수 없지만
매일 비상을 꿈꾸며
나는 세상 위에서 널뛰기를 한다
* 오른쪽 어깨가 쑤셔온다.
다른 사람들의 시를 꺼내서 읽다가
쓰다가만 내 시를 고치다가
시를 버리다가
바람 부는 바닷가에 나갔다.
크고 작은 돌멩이를 주워 오른쪽 팔로
바다를 향해 던졌다.
되도록 이면 멀리, 아주 멀리
던져진 자리 흔적이 생기기를 바랬지만
그 자리엔 잠시 세찬 물살만 일 뿐
이내 파도가 덮어 버려
던져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나는 매일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진다.
시를 쓰는 일과
바다에 돌 던지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쑤셔온다.
* 밤(夜), 청초호
청초호 한 가운데서
누가 살풀이춤 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호수 위를 둥둥 걸어가다가
은빛 날개옷 되어 떠내려가더니
함경도 앞 바다 그리워
버선발로 물위를 건너뛰다가
흰 수건 던져놓고 쓰러지다가
아름다운 목 뒤로 꺾으며
별을 움켜잡다가
푸른 밤
물위에서 누가 살풀이춤 춘다.
두고 떠나 온 눈동자를 위하여
안개 숲을 가로지르다가
흰 꽃등 되어 미끄러지다가
도시 불빛 양손에 들고
이승과 저승
남과 북을
버선발로 건너뛰고 있다
* 어떤 수배자
눈썹 짙은 사나이가
영동선열차 안에서 봄 강산 내다 보고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쏘아대는 주파수에
몸 움추리며 긴장의 촉수 바짝 세우고있다
비닐 봉지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다가
다시 세상과 연결 고리 맺으려는 듯
누런 명함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잘못 들어선 인생의 벼랑길에서
속죄하듯 고독한 과거 속으로 들어가
까만 손톱밑 쉴새없이 염주 알 굴리고 있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어떤 사나이가
흔들리는 눈동자 그 너머
산 벚꽃 환한 차 창 밖을 내다보고있다
* 봄이 오고 있더라
설악산 깊은 계곡
보일 듯 말 듯 산수유가
깨금발로 서서
꽃망울 트고있더라
노란 그 모습 어찌 이쁜지
목욕탕에서 훔쳐 본
열 서너 살쯤 된 계집애
톡 불거진 젖 망울 같아서
넋 놓고 쳐다보고 있으니
잔설(殘雪)에 몸 털던 설악이
그런 나를
빙그레 내려보고 있더라
봄이 오고 있더라
* 시작 노트
안개 낀 통리역을 지나왔다.
태백산 정상에서 무한시공(無限時空)을
경계도 없이 떠도는 물방울들의
무리가 부러웠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면 타인들이
그어 놓은 금 안에서 나는 살아 왔고
또 그렇게 살아 갈 것이다
여러 번 계절이 지나갔다
나이 들어간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요즘
미세한 물방울의 무리처럼 내 영혼의 자유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이전글갈뫼원고 - 최월순 02.10.08
- 다음글갈뫼 원고 10편 추가 02.10.01
댓글목록

이화국님의 댓글
이화국 작성일
"타인들이 그어놓은 금 안에서 나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br />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앞으로 꼭 그렇게는 살아가지 마시옵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