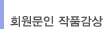훈춘 여행기 4편
페이지 정보

본문
Ⅳ. 남의 땅에서 본 우리 땅
1. 배두산(장백산) 구름만 보다
새벽 4시 모닝콜로 잠이 깨었다.
일행 중에서 이곳이 초행인 사람들끼리 백두산(이곳에서는 장백산) 관광을 떠났다.
뚸푸(두부)장수의 종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훈춘거리를 떠난 지 2시간 뒤 연길에서 맛없는 해장국으로 아침을 때운 시간이 06시.
6시간 내내 졸다 깨다 하며 낯선 풍광을 스쳐보냈다.
12시에 도착 한 곳이 안도현 이도백화였다.
백화 임업국의 미인송 공원의 소나무들이 장관이였다.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이곳 아니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였다.
고려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어디를 가나 한국인 관광객은 표시가 나는지,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일행을 둘러싸고 물건을 팔려고 흥정을 부쳐 왔다.
이상한 물건(?)을 들고 와서 우리 돈 5만원을 부르더니, 식당에서 나올 때는 3만원, 버스에 올라 탈 때는 만원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다시 1시간 정도 걸려 드디어 장백산 입구라는 간판이 보였다.
2시 정각에 장백산 정상에 오르는 찝차를 탔다. 정상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고, 30분 구경시간을 기다렸다 다시 태우고 내려 오는데 대당 우리 돈 만원 이였다.
두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자동차 길이 산 정상까지 벽돌을 깔아 만들어져 있었다.
신기한 것은 그 자동차 길이 자연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였다.
그 구불구불한 길을 마치 경주용 자동차처럼 달리는 찝차 속에서 바라다보는 산기슭은 야생화 천국이였다. 키 작은 풀들이 형형 색색의 꽃초롱을 달고 비단처럼 깔려 있었다.
그 어떤 예술가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리라!
자연이 빚어낸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이 가까워졌다.
산 정상으로 갈수록 안개가 짙어지더니, 결국 정상에 도착하니 온통 구름밭 이였다.
아깝다! 천지는 그 물빛조차 내게 허락하지를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30분을 기다려 봤지만, 천지는 결국 내게 몸을 열지를 않았다.
구름만 싫컷 바라보다 내려가기로 했다.
하긴 14번를 올라 왔어도 천지를 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장백폭포를 구경하러 올라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올려다 본 장백폭포는 신비로웠다.
내려오는 길에 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유비통신)가 나를 실소하게 만들었다.
장백폭포를 위에서 구경하도록 만든 계단을 만들어 중국 당국에 20년 임대를 하고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우리 한국사람이라든가...
노천 유황 온천샘에 계란을 삶아 파는 저 샘구덩이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1년에 1억이라나 뭐라나...
어쨌거나 계란도 하나 먹어보고, 동네 목욕탕 같은 온천욕도 하고, 오후 4시 다시 훈춘으로
길을 틀었다. 훈춘에 도착하니 밤 12시.
30분을 위한 20시간의 긴 여정이였다.
2. 사완자 다리에서
일행 몇이서 택시를 전세 내서 사완자 다리를 구경갔다.
사완자 다리는 두만강을 가로질러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이쪽 다리는 멀쩡한데
북한 땅 쪽에서 한 10여 미터가 끊겨져 있었다.
택시를 다리 한가운데 세워 기다리게 해 놓고 걸어서 다리가 끊어진 끝가지 갔다.
바로 10미터 저쪽이 우리 땅 북한이다.
산과 들의 생긴 모습도 같고,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저 곳이 왜 이리 먼 걸까?
빤히 올려다 보이는 곳에 그들의 초소가 보였다.
방목하는 짐승들도 보였다.
그러나 그 곳은 우리에겐 접근 금지구역 이였다.
남의 땅에서 바라다보는 우리 땅은 왜 이리 가슴을 시려 오게 하는지...
그 날 사완자 다리 위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보다 내 마음속에 부는 바람이 더 차가웠다.
3. 왼쪽은 소련, 오른 쪽은 북한, 내가 서있는 길은 중국 땅
소련, 북한, 중국 3개 나라의 국경이 맞닿은 곳, 방천으로 길을 떠났다.
두만강가를 따라 길게 뻗은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와 포장 도로를 따라 가는 길은 여전히 낯설었 다.
권하지구를 지나다 보니 북한 땅이 바로 코앞이다.
뉴스에서 탈북자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내 뇌 세포 속에 입력된 압록강과 두만강은 너무나 거대한 강이였다. 그 거대한 강을 어떻게 넘어서 탈북을 했다는 것인지?
그 어리석은 의문은 이곳에서 두만강을 직접 보고 나서야 해결되었다.
얼마쯤 갔을까? 먼저 이곳을 방문했던 회원 하나가 건너편에 우뚝 솟은 산을 가리키며, 저 산의 뒤쪽이 바로 그 유명한 아오지 탄광이란다.
그러고 보니 가는 길 양쪽 모두가 노천 탄광이였다.
지하에서 캐는 석탄이 아니라 노천에서 슬슬 긁어내고 있었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왼쪽에 길다란 철조망이 보였다.
바로 지척이 소련 땅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은 중국, 왼쪽 10미터 옆에는 소련, 좁은 강폭 하나를 건너면 바로 북한 땅.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좁았던 강폭이 점점 넓어지고 황토색으로 탁해지더니 드디어 방천이다.
이 곳 통일전망대처럼 만들어진 전망대에 오르니, 멀리 강 아래 소련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교가 보이고, 그 철교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왼쪽은 시베리아의 툰드라 숲과 늪이 섞여 널따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오른쪽은 올망졸망한 북한의 푸른 산들이 그 발자락을 두만강에 담그고 있었다.
손에 잡힐 듯 바라다 보이는 저 아름다운 땅들의 살갗 위에 접근금지의 해골표시를 주렁주렁 매단 가시철망을 박은 오만한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돌아오는 길 두만강 물에 손을 담그기 위해 강가로 갔다.
마침 이쪽 중국 어부가 강에 그물을 걷기 위해 노를 젓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일행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생각을 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 ...’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해도, 예술은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 이전글훈춘여행기 - 에필로그 05.12.08
- 다음글 훈춘 여행기 3편 05.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