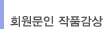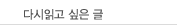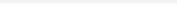근황 - 박해람
페이지 정보

본문
근황
머리맡을 정하지 못해
잠이 옮겨 다닌다.
내가 옮겨 다닌 집들은 向을 사상쯤으로 알고 있었다.
동쪽 울타리 밑으로 隱逸者가 따라다녔고*
向念에선 파초라든가 비파 같은 更紙지들이 피고 졌다
그것들을 따다 한낮엔 밝은 종이로 쓰고
밤엔 검은 종이쯤으로 치부했다.
한 채의 집이 얼마나 많은 주변과 掃灑를 몰고 다니는지에 대해
외간의 책들로는 배우지 못했다.
受賞의 제목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숲을
놀란 草食들이 달려갔다.
그런 날은 뿔이 두근두근 뛰었다.
십리 밖에 취하는 신발을 벗어두고
그 옛날 아버지의 취한 옷소매를 그리워했다.
한 번 아들로 태어난 사실은 바뀌지 않고
어쩌다 아버지가 된 사실도
저잣거리를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위로를 추렴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시인으로 철없는 結句를 짓고
사람으로 뻔뻔한 치욕을 편들었다.
이만하면 죽기 딱 좋은 過誤라는 생각이 든다.
흰 꽃이 익으면 함께 부슬부슬 봄날의 궂은 날씨로 반죽한
국수를 먹으로 가자고 했고
어쩌다 맨 정신의 친구에게 술 취한 堂號를 부탁하고
虛言처럼 들고나는 문을 세웠다.
무료의 손끝을 모아
정원을 꾸미는 날들이 쏠쏠하다.
마른고추를 거둬들이는데 소나기가 묻어 있다.
그럭저럭 머리말을 너무 많이 읽는다.
* 陶淵明
- 이전글감량 - 박해람 17.12.06
- 다음글목련 후기 / 복효근 17.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