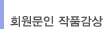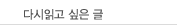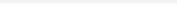[구두 수선집 / 최명선
페이지 정보

본문
구두 수선집
최명선
무거운 짐이 힘겨웠는가
길 끌다 고장 난 나의 수레여
판사 같은 수선공
고여있던 어제 거꾸로 놓더니
절뚝거리던 시간을 거침없이 떼어낸다
희망을 갈아붙인 후
탕탕탕, 힘차게 안전못을 박는다
낡아도 차마 버릴 수 없던 삶의 내력이
망치 끝에서 출렁 되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라고, 걸어가라고
초심으로 단단해진 생의 수레에
들메끈 조여주는 구두수선공
허름하고 낡은 것들 모여들지만
무성의 법륜소리 낭랑한 이곳은
영혼의 척추까지 반듯하게 세워주는
불립문자 가득한 한 평짜리 선방이다
- 이전글바람 분다 13.05.30
- 다음글사랑 11, 김승희 13.05.27
댓글목록

이은자님의 댓글
이은자 작성일
<p>참 좋구려</p>
<p>내 신발은 내게와서 보통 15년 쯤 되고서야 안녕이다.</p>
<p>모두 그 신기리아저씨가 있어 가능했다.</p>
<p>근데 그 아저씨 탄식 왈 "이 기술 전수자가 귀하다. 요새사람들 모두 오래 배우는 데엔 질색한다."</p>
<p> 그이들 다 세상 떠나면 우리 후손들 신발은 누가 명줄 이어주나?</p>
<p> 단벌에 후딱 버리겠지요?</p>

최명선님의 댓글
최명선 작성일
<p>
부끄러워 올려주신 글에 답글도 못 올렸는데..</p><p>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p><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