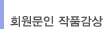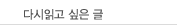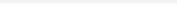이성선 추모의글
페이지 정보

본문
<李聖善 詩人 追慕>
하늘 길 열고 간 자유인
朴 明 子
우리 강산에 아름다운 5월이 찾아들면 깨끗한 영혼 하나 내 가슴에 별처럼 떠
오른다. 언제나 하얀 운동화 신고 타박타박 산길을 걸어가는 무소유한 나그네의 초상 “이성선 시인!” 꽃잎 스쳐가는 미풍같이 낮으막한 그의 음성 귓가에 들여오는 듯 그립다. 그는 평생 고뇌하는 시인이었다.
깊은밤 홀로 촛불 앞에 꿇어앉아 그가 추구한 길은 과연 어떤 것이 었을까.
손가락 헤어보면 그와의 교우 설흔해 넘도록 그의 뜨락 가까이 서성거려 보았지만 그는 언제나 무엇에 얽매이기를 거부하였다. 일상에서 늘 자유롭고자 몸부림쳐왔다. 그리하여 현대인이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조차 소유하지 않으려 하였다. 유산받은 토지, 가옥, 전자제품, 자동차, 핸드폰 유행하는 패션 같은 필수품조차 부담스러워 하였다. 개가 벼룩을 털어내듯 모두를 털어 버리고 영혼하나 깨끗이 간직하고 별나라로 곧바로 걸어가고 싶어하였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이 차라리 아침이슬 한방울보다 그에게는 가치롭지 못하였다. 그는 지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가용도 컴퓨터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혼자 산길을 걸으며 새소리에 가슴을 열고 맑은 가슴으로 별까지 가고 싶었던 시인. 그는 처용아내 고운 가랭이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숲을 헤매다녔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한 세계는 자유의 동산이었으니 다음 그의 유작 「자유인」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오솔길을 걸어본다.
「자유인
하늘 버틸 기둥을 깎는 사람
자유인이 되고자 매일 머리를 깎는다
매일 밤 한편의 시로 세상의 지붕을 덮고
밤 하늘 성좌를 바라보며
그를 찾아오는 길을 맞이한다
깊이 그를 데리고 강물을 따라 갈 때
강물 위에 그림자 비추고 걸어 간다」
시에서 읊었듯이 그는 자유인이 되고자 머리조차 깎아 버린다.
다만 시 한편으로 세상의 지붕 삼고 시 한편 덮고 빈벌에 누워 별을 보고 싶어 하였다. 세상의 명리, 이권같은 것은 그에게 필요대상이 아니었다.
그럼 그가 전신투구하여 사랑한 대상은 과연 무엇이던가.
평생을 두고 목메어 부른 가인이라도 있었던가.
다음 유작 「시 한편」을 살펴보자
「시 한편
말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가을에
내 가난한 손이 당신에게
바칠수 있는 것은
오직 시 한편 뿐입니다
허공으로 내리는 나뭇잎이
무한히 떨고 또 떨며 내리듯이
영혼의 백지 위에 떨리는 손으로
밤새워 시를 써서 바칩니다
가슴을 비우고 비운 후에
그 자리 당신 얼굴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 시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누구였을까. 당신이라는 절대자가 시인에게 누구일까. 침묵으로 시한편 써서 바치는 그는 누구였을까?
가슴 비우고 무소유한 마음으로 시한편 써서 바치는 당신 !
그가 전 삶을 모아 전신투구한 대상은 오직 시가 아니였을까.
시를 향하여 엎드리고 기도하듯 추구한 시 !
그의 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작업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한다
어느날 이 시인이 자신을 「벌레시인」 이라 불러 우리를 놀라게 한적이 있다
벌레는 인식의 세계가 없는 미물이 아닌가. 극도의 자기비하로 한 마리 벌레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 두던 이성선시인 . . .
그는 생전에 어느 누구와도 가슴을 열고 정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안으로 무섭게 자신을 다스리며 피나는 채찍을 들어 자학하는 길을 택하여 스스로 외곬으로 걸어갔다. 무한 우주공간 속에 혼자 오두막을 짓고 바다와 산을 불러들이기도 하였다. 정신의 거인처럼 우주를 가슴에 보듬으려고 하였다.
어깨에 나뭇잎하나 떨리우는 것을 보며 「우주가 내몸에 손을 얹었다」 하였으니 . . .
다음 유고시 「나의 집」을 열고 그의 내면의 향기를 음미해보자
「나의 집
설악산은 내 집의 지붕입니다
밤이면 추녀 끝에 별이 뜨고
기왓골 깊은 골짜기 물소리가 높습니다
동해 푸른 바다는 나의 앞마당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뜨락을 쓸면
출렁이는 마당 푸른 잔디 위에 생선 한 마리
이슬 묻어 뒹구는 싱싱한 해 한 마리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숯불에 구워
매일 아침 상에 놓습니다 」
우주 무한대의 공간속에 집을 짓고 해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려는 정신의 거인 이성선 시인 . . . .
지금부터 32년전 시간의 언덕을 거슬러 보면 갈뫼창간 당시 이성선시인과 나는 전화통화도 자주 하였으며 가끔 겨울바다를 보며 소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70년도 문화비평에 이 시인이 추천되고 나는 자극을 받아 73년도 현대문학에 등단 하였으니 가까운 교우 관계가 좁은 속초바닥에서 이루어졌다. 이따금 장난을 걸어오지만 비교적 예의가 반듯하였다. 87년도 전예원에서 시집 「별이 비치는 지붕」이 출간되어 나에게 한권 주었다. 즉시 시집을 완독하고 나는 그를 골려 주려 전화를 걸었다.
「이성선 선생님! 얇은 시집 한권 속에 별이라는 낱말이 39번 나오네요.
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나 시에서 별을 추구하는 일은 낡은 사
고방식 아닌가요? 현대라는 다원화 구조속에서 아직 시인이 별을 헤이고 있
음은 시대착오가 아닐까요?」
이성선 시인과 나는 논쟁도 장난도 많이하며 계속 우정을 나누었다.
어떤날은 느닷없이 나에게 「연애좀 겁시다」하며 곁에 오면 나는 총알
처럼 쏘아준다.
「현실에 발 붙이지 못하고 비틀대는 보헤미안은 싫다구요! 꿈 깨요 꿈 깨!」
지금 생각하면 그도 고독한 남자였다. 따끈한 차 한잔 나누면서 그의 깊은 허무를 헤아려 주지 못한 내가 야속해질때가 있다.
영하의 백담사 계곡에 산산이 헤어진 그의 영혼. 이제 그의 존재의 그림자조차 지상에서 다시 찾아 볼수 없게 되다니 . . .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던 무궁한 시심의 매장량. 그리고 대나무처럼 외곬의 행동양식. 은장도 같이 날이 선 자존심 . . .
이성선시인의 영상은 아직도 내 영혼의 뜨락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하늘 길 열고 간 자유인
朴 明 子
우리 강산에 아름다운 5월이 찾아들면 깨끗한 영혼 하나 내 가슴에 별처럼 떠
오른다. 언제나 하얀 운동화 신고 타박타박 산길을 걸어가는 무소유한 나그네의 초상 “이성선 시인!” 꽃잎 스쳐가는 미풍같이 낮으막한 그의 음성 귓가에 들여오는 듯 그립다. 그는 평생 고뇌하는 시인이었다.
깊은밤 홀로 촛불 앞에 꿇어앉아 그가 추구한 길은 과연 어떤 것이 었을까.
손가락 헤어보면 그와의 교우 설흔해 넘도록 그의 뜨락 가까이 서성거려 보았지만 그는 언제나 무엇에 얽매이기를 거부하였다. 일상에서 늘 자유롭고자 몸부림쳐왔다. 그리하여 현대인이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조차 소유하지 않으려 하였다. 유산받은 토지, 가옥, 전자제품, 자동차, 핸드폰 유행하는 패션 같은 필수품조차 부담스러워 하였다. 개가 벼룩을 털어내듯 모두를 털어 버리고 영혼하나 깨끗이 간직하고 별나라로 곧바로 걸어가고 싶어하였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이 차라리 아침이슬 한방울보다 그에게는 가치롭지 못하였다. 그는 지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가용도 컴퓨터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혼자 산길을 걸으며 새소리에 가슴을 열고 맑은 가슴으로 별까지 가고 싶었던 시인. 그는 처용아내 고운 가랭이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숲을 헤매다녔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한 세계는 자유의 동산이었으니 다음 그의 유작 「자유인」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오솔길을 걸어본다.
「자유인
하늘 버틸 기둥을 깎는 사람
자유인이 되고자 매일 머리를 깎는다
매일 밤 한편의 시로 세상의 지붕을 덮고
밤 하늘 성좌를 바라보며
그를 찾아오는 길을 맞이한다
깊이 그를 데리고 강물을 따라 갈 때
강물 위에 그림자 비추고 걸어 간다」
시에서 읊었듯이 그는 자유인이 되고자 머리조차 깎아 버린다.
다만 시 한편으로 세상의 지붕 삼고 시 한편 덮고 빈벌에 누워 별을 보고 싶어 하였다. 세상의 명리, 이권같은 것은 그에게 필요대상이 아니었다.
그럼 그가 전신투구하여 사랑한 대상은 과연 무엇이던가.
평생을 두고 목메어 부른 가인이라도 있었던가.
다음 유작 「시 한편」을 살펴보자
「시 한편
말을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가을에
내 가난한 손이 당신에게
바칠수 있는 것은
오직 시 한편 뿐입니다
허공으로 내리는 나뭇잎이
무한히 떨고 또 떨며 내리듯이
영혼의 백지 위에 떨리는 손으로
밤새워 시를 써서 바칩니다
가슴을 비우고 비운 후에
그 자리 당신 얼굴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 시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누구였을까. 당신이라는 절대자가 시인에게 누구일까. 침묵으로 시한편 써서 바치는 그는 누구였을까?
가슴 비우고 무소유한 마음으로 시한편 써서 바치는 당신 !
그가 전 삶을 모아 전신투구한 대상은 오직 시가 아니였을까.
시를 향하여 엎드리고 기도하듯 추구한 시 !
그의 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작업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한다
어느날 이 시인이 자신을 「벌레시인」 이라 불러 우리를 놀라게 한적이 있다
벌레는 인식의 세계가 없는 미물이 아닌가. 극도의 자기비하로 한 마리 벌레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 두던 이성선시인 . . .
그는 생전에 어느 누구와도 가슴을 열고 정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안으로 무섭게 자신을 다스리며 피나는 채찍을 들어 자학하는 길을 택하여 스스로 외곬으로 걸어갔다. 무한 우주공간 속에 혼자 오두막을 짓고 바다와 산을 불러들이기도 하였다. 정신의 거인처럼 우주를 가슴에 보듬으려고 하였다.
어깨에 나뭇잎하나 떨리우는 것을 보며 「우주가 내몸에 손을 얹었다」 하였으니 . . .
다음 유고시 「나의 집」을 열고 그의 내면의 향기를 음미해보자
「나의 집
설악산은 내 집의 지붕입니다
밤이면 추녀 끝에 별이 뜨고
기왓골 깊은 골짜기 물소리가 높습니다
동해 푸른 바다는 나의 앞마당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뜨락을 쓸면
출렁이는 마당 푸른 잔디 위에 생선 한 마리
이슬 묻어 뒹구는 싱싱한 해 한 마리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숯불에 구워
매일 아침 상에 놓습니다 」
우주 무한대의 공간속에 집을 짓고 해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려는 정신의 거인 이성선 시인 . . . .
지금부터 32년전 시간의 언덕을 거슬러 보면 갈뫼창간 당시 이성선시인과 나는 전화통화도 자주 하였으며 가끔 겨울바다를 보며 소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70년도 문화비평에 이 시인이 추천되고 나는 자극을 받아 73년도 현대문학에 등단 하였으니 가까운 교우 관계가 좁은 속초바닥에서 이루어졌다. 이따금 장난을 걸어오지만 비교적 예의가 반듯하였다. 87년도 전예원에서 시집 「별이 비치는 지붕」이 출간되어 나에게 한권 주었다. 즉시 시집을 완독하고 나는 그를 골려 주려 전화를 걸었다.
「이성선 선생님! 얇은 시집 한권 속에 별이라는 낱말이 39번 나오네요.
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나 시에서 별을 추구하는 일은 낡은 사
고방식 아닌가요? 현대라는 다원화 구조속에서 아직 시인이 별을 헤이고 있
음은 시대착오가 아닐까요?」
이성선 시인과 나는 논쟁도 장난도 많이하며 계속 우정을 나누었다.
어떤날은 느닷없이 나에게 「연애좀 겁시다」하며 곁에 오면 나는 총알
처럼 쏘아준다.
「현실에 발 붙이지 못하고 비틀대는 보헤미안은 싫다구요! 꿈 깨요 꿈 깨!」
지금 생각하면 그도 고독한 남자였다. 따끈한 차 한잔 나누면서 그의 깊은 허무를 헤아려 주지 못한 내가 야속해질때가 있다.
영하의 백담사 계곡에 산산이 헤어진 그의 영혼. 이제 그의 존재의 그림자조차 지상에서 다시 찾아 볼수 없게 되다니 . . .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던 무궁한 시심의 매장량. 그리고 대나무처럼 외곬의 행동양식. 은장도 같이 날이 선 자존심 . . .
이성선시인의 영상은 아직도 내 영혼의 뜨락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첨부파일
-
이성선_시인_추모.hwp (29.2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1-02-07 10:5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